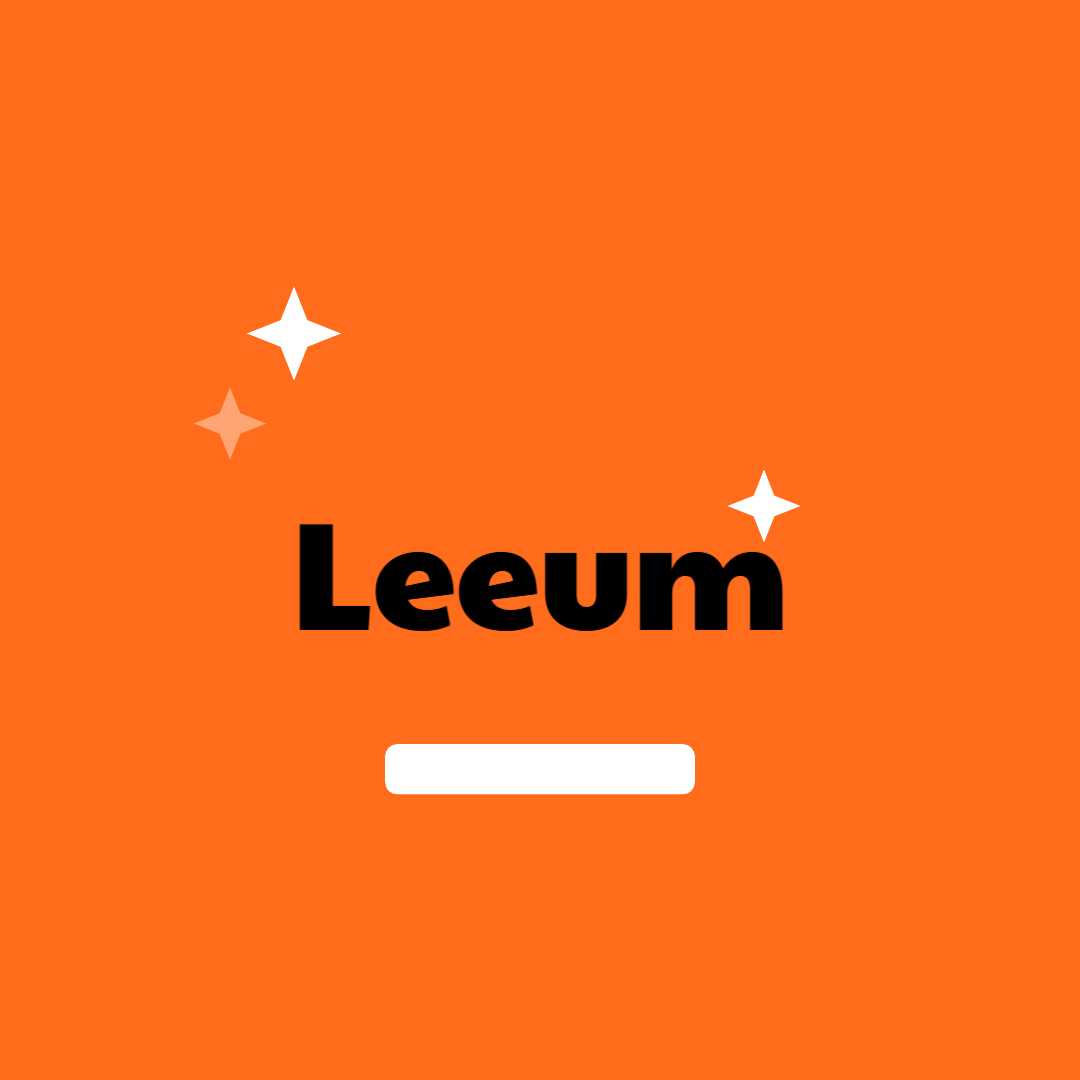-
목차
과학 움직임 필라테스와 정골의학의 만남
마텔린 블랙은 필라테스 강사 중에서도 정골의학(Osteopathy)적 관점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일상적으로 익숙한 동작들에 새로운 해부학적 통찰과 세밀한 움직임 분석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골의학은 신체의 각 구조가 본래의 자리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인체가 스스로 치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통합 의학 분야다.
마텔린 블랙은 필라테스의 원리를 토대로 이 정골의학적 사고방식을 적용해, 동작의 크고 작은 범주를 모두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근막·관절·신경계의 협응을 중시한다. 특히 마텔린 블랙이 강조하는 **‘과학 움직임 필라테스’**는 동작 하나하나를 해부학적으로 분해하여 뼈와 관절, 근육, 근막의 상호 작용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움직임을 어떻게 재교육하느냐에 따라 몸의 기능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몸의 모든 움직임은 연속체(Continuum)로 존재하며,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 바로 큰 움직임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정골의학적 시각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골격-근막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정렬하면, 자율신경계나 혈류 순환, 림프 배출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함께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마텔린 블랙은 이 둘의 이론적·실천적 접점을 찾아, 필라테스에서 흔히 간과되는 ‘발바닥’부터 시작되는 미묘한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발바닥과 지면의 연결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서 있거나 걷는’ 자세로 보낸다. 그만큼 발바닥은 인체에서 가장 먼저 지면과 만나는 부위이며, 뼈와 근육, 인대, 근막이 합쳐진 복합 구조로서 전신 정렬의 기초가 된다.
발에 존재하는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횡아치가 각각 손상되거나 변형되면, 무릎이나 골반, 척추까지 연쇄적인 부정렬과 보상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마텔린 블랙은 이 점을 ‘지면과의 대화(Conversation with the Ground)’ 라고 부르며, 발이 지면을 어떻게 눌러 주고 받느냐에 따라 상부 골격의 안정성과 근막 긴장 패턴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바닥을 단순히 ‘밀어내는 지렛대’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중심축(Core axis)을 연결하는 첫 관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스탠딩 자세에서 뒷꿈치와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을 통한 삼중 지지 삼각형을 정확히 느끼는 연습은, 골반 높이 차이나 무릎 회전, 척추 측만 등을 교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발바닥의 근막(Plantar fascia)을 부드럽게 풀고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치의 탄성을 되찾는 것도, 발에서부터 이어지는 무릎—골반—척추의 정렬을 재교육하기 위한 핵심 작업이다. 마텔린 블랙은 이를 위해 폼롤러나 테라 밴드, 토닝볼 등 소도구를 활용하여 발가락, 발바닥 근육, 발목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체험해 보도록 제안한다.
작고 미세한 움직임, 몸 전체를 바꾸다
마텔린 블랙이 말하는 “큰 움직임에 가려져 간과되기 쉬운 작고 미세한 움직임” 은 특정 동작의 전·중·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근육의 작동이나 관절의 각도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브릿지(Bridge) 동작을 할 때 많은 이들은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큰 동작’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발가락이 어떻게 바닥을 잡고 있으며, 발목이 미세하게 회내(pronation)되거나 회외(supination)되는지,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는지, 척추의 각 분절이 위로 견인되는 느낌이 있는지 등 수많은 ‘작은 움직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정골의학 관점에서 보면, 척추가 단순히 경추·흉추·요추로 나뉜 덩어리가 아니라, 각 마디가 근막과 인대로 연결되어 미세한 움직임을 분절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구조라고 본다. 즉, 발에서 시작된 미세한 회전이나 체중 이동이 결국 흉추의 회전이나 횡격막 움직임, 심지어 머리 정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텔린 블랙은 이를 “생체역학적 파동(Biomechanical Wave)”이라고 설명하며, 발→발목→무릎→고관절→골반→척추→견갑골→두개골로 이어지는 움직임의 전이가 정확히 이뤄질 때 몸은 ‘큰 무대’에서 원하는 동작을 가볍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이처럼 작고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째, 감각 인식(Somatic Awareness). 발가락 하나하나가 바닥을 어떻게 딛고 있는지, 그에 따라 무릎과 골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하며 스스로 정보를 축적한다.
둘째, 중립 정렬(Neutral Alignment). 발바닥이 맞닿은 지면을 토대로 중립 골반·척추를 유지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부여함으로써 근막·관절을 더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하는 전략이다.
실전 접근법|발에서 척추까지 재교육
마텔린 블랙이 책에서 제시하는 접근 방식은, 단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만 쓸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다.
발바닥—척추 간의 연결을 실천적으로 익히면, 서기·걷기·앉기 같은 일상적 동작 속에서 ‘몸을 어떻게 쓰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서 있을 때 발바닥 압력을 편중시키고, 골반이 전방 혹은 후방으로 기울어져 허리나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마텔린 블랙은 이 습관을 인식하고 교정하기 위해, 먼저 발바닥 삼중 지지(뒤꿈치·엄지발가락·새끼발가락)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는지 확인하게 한다. 그 다음 고관절과 골반의 중립 위치를 찾고, 복횡근(Transversus Abdominis)을 포함한 코어 근육이 살짝 수축되면서 척추를 세워주게끔 유도한다.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데, 보통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달릴 때는 더 복잡해진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사 동작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 발현된다. 마텔린 블랙의 강조점은,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의식적으로 꺼내 보고 재교육하자”**는 것이다. 정골의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이 접근은, 과도한 근력·속도·유연성만을 좇기보다는 ‘동작 하나하나를 해부학적으로 세밀히 해석하고,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이렇게 발바닥부터 척추까지 모든 연결 부위를 세심하게 다루어
생체역학적 파동이 원활해지면, 자극적인 큰 동작 없이도 몸 전체의 재정렬, 통증 경감, 움직임 효율 증대라는 결과를 얻는다.
마텔린 블랙의 **‘과학 움직임 필라테스’**가 강조하는 해부학적 접근과 정골의학적 사고방식은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체 구조의 연결을 새롭게 조명한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몸에 부정적인 패턴을 쌓아왔듯,
이제는 발바닥—골반—척추를 축으로 한 정렬과 미세 움직임의 재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나갈 차례다. 발과 지면의 만남이 단순히 “서 있고 걷는 것”이 아니라, 곧 몸 전체가 균형 잡힌 유기체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동력” 임을 알게 된다면, 본래 가지고 있던 동작의 잠재력과 기능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마텔린 블랙의 정골의학적 필라테스 접근법은, 가장 익숙한 부위(발)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부위(척추)까지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며, 큰 동작 뒤에 숨어 있는 작고 미세한 움직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몸을 새로 배우고,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내 몸 안의 내부 조절 능력”을 일깨우는 경험을 할 수 있다.'필라테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라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렬인가? 중심인가? (0) 2025.04.03 센터드 필라테스의 6대 원칙 완전 해설|움직임의 본질을 찾다 (0) 2025.04.03 몸과 마음의 연결|센터드 필라테스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 (0) 2025.04.03 필라테스 호흡법 제대로 배우기|심부 근육을 깨우는 시작 (0) 2025.04.02 골반 정렬이 몸 전체를 바꾼다|센터드 필라테스로 자세 교정하기 (0) 2025.04.02
leeum
몸의 원리를 이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