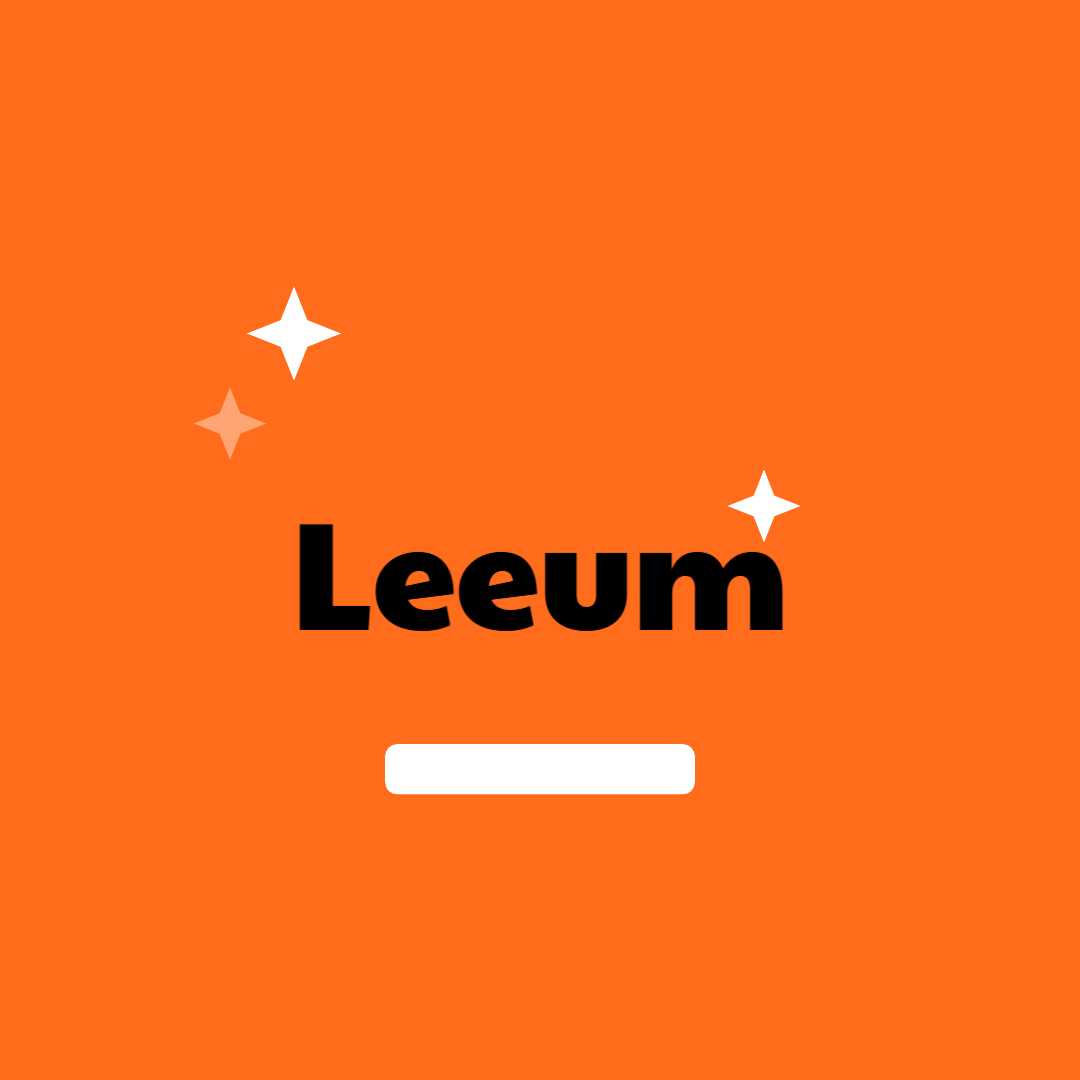-
목차
시간과 공간 속 하지 움직임
우리는 매 순간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맞물려 진행된다.
춤을 추거나, 서서 걸어 다니는 사소한 행위조차도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어떤 리듬으로’ 이뤄진다.
무용가이자 안무가였던 Meece Cunningham은 1968년,
“시간 속의 공간은 어떤 움직임이든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며,
반대로 아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고요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구조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움직임이 공간을 점유한다’**는 개념과도 맥을 같이한다.인체의 구조 또한 기능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넓은 댄스 스튜디오에서 춤을 춘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몸은 이미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직선으로 움직일지, 원을 그리며 회전할지, 빙빙 제자리를 맴돌지를 미리 감지한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탄생하는 움직임의 ‘경로’는, 결코 무작위가 아니다.
몸을 구성하는 뼈와 근육, 인대와 근막 등은 각자의 역할과 한계 내에서
상호 작용하여 기능적(Functional)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결국 **“공간–시간–인체 구조”**의 삼위일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움직임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하지(Lower Extremity)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무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는다.
서 있기, 걷기, 달리기, 점프 등 대부분 하중을 지탱하는 동작은
하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하지 구조 속에는 나사집기전(Screw Home Mechanism) 이나 나선형(spiral) 움직임처럼
한층 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메커니즘들이 숨어 있다.
특히 무릎은 하지의 중심 관절로서,
단지 굴곡과 신전만 하는 ‘경첩’ 관절이 아니라 회전(나선) 요소가 더해진 복합적인 관절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우리의 움직임이 단순한 수평·수직 이동이 아니라
“시간·공간·신체 구조가 맞물린 다차원적 과정”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무릎의 구조와 이완
하지 움직임을 논할 때, 무릎은 핵심적인 분기점이다.
흔히 무릎을 단순히 “굴곡—신전”만 하는 관절로 여기지만,
사실 무릎은 그 안에 작은 회전(내회전·외회전) 동작이 내재된 복합 관절이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이 바로 나사집기전(Screw Home Mechanism) 이다.
뼈(대퇴골, 경골)와 인대, 연골, 근육이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무릎이 완전히 신전될 때 경골이 약간 외회전되며 안정감을 얻는 현상을 말한다.
걸을 때나 달릴 때, 심지어 앉았다 일어설 때도 이 나사집기전이 발생한다.무릎의 전면부는 대퇴사두근(Quadriceps)과 슬개골(Patella) 주변 구조로 구성되며,
바깥쪽(외측) 구조물에는 외측 측부인대(LCL), 비골(Fibula) 주변 조직이,
안쪽(내측) 구조물에는 내측 측부인대(MCL), 내측 반월판 등이 위치한다.
또 무릎 뒤쪽(후면부)에는 슬와근(Popliteus)과 햄스트링 일부가 자리 잡아,
무릎 굴곡과 회전을 돕는다.
이처럼 앞–뒤–안–밖에 포진한 각각의 구조가 협력하여,
무릎이 회전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나선형 움직임’을 실현한다.“무릎 이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나선형 구조가 과도하게 긴장되면 무릎 주변 조직이 경직되고,
나사집기전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 보행 패턴이나 달리기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히 이완되어 있으면 큰 충격(예: 달리기, 점프)을 흡수하고
골반–발목 연결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무릎 이완과 회전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히 “무릎 굴곡—신전을 잘 해야 한다” 이상의 통합적 움직임 관점이 생긴다.
이는 곧 하지 전체가 나선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이며,
후술할 “하지의 나선형 움직임”의 본질적 기원이다.
나선형 움직임의 본질
하지를 한 번 유심히 살펴보면,
고관절은 볼-소켓(ball-and-socket) 형태로 여러 방향에 움직임을 허용하고,
무릎은 복합 관절로서 굴곡—신전—(약한)회전 등을 담당하며,
발목 아래로 이어지는 발등, 발바닥, 종아리 근막까지
나선형(spiral) 라인이 전신과 이어진 구조를 이룬다.
즉, 고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무릎과 발목도 따라 회전해야 통합적 움직임이 가능하다.이 ‘나선형 라인(Spiral Line)’은
해부학적 근막(Fascia)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몸의 앞뒤와 좌우를 횡단하며 회전 요소를 제공한다.
예컨대 대퇴의 외측 근막(장경인대, TFL 근육 주변)과 내측(내전근, 굴근) 간의 미세한 균형은
하지를 “돌아가게(rotate)” 만드는 근막 긴장 패턴과 연관된다.
만약 이 중 한 곳에 유착이나 과도한 긴장이 있으면,
나선형 움직임이 원활해지지 못해
“걸을 때 발끝이 자꾸 바깥을 향한다”
혹은 “무릎이 안쪽으로 말린다”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나사집기전 역시 이 나선 구조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고관절부터 시작된 회전이 무릎을 거쳐 발목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무릎이 외회전—내회전을 적절히 소화해야만 부드러운 보행이나 달리기가 가능하다.
이 움직임이 공간·시간과 맞물리면,
춤을 춘다거나 빨리 달릴 때 원이나 S자 경로를 자연스럽게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다.결국 “나선형 움직임은 겉으로는 직선적인 이동처럼 보여도,
내부 관절들은 미세하게 회전하고 풀리며 충격과 에너지를 분산·조절한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인체 구조의 확장적 시각
이렇듯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지 움직임을 해부학적—기능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단지 “걷는다, 달린다, 춤춘다”라는 행위가
얼마나 복합적인 구조와 협응을 요구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신체 나선의 기원, 무릎 이완과 나사집기전, 하지의 앞뒤·내외측 조직 모두가
각기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을 가로지르는 동작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마치 넓은 댄스 스튜디오를 상상해볼 때,
그 공간 어딘가에 몰아치는 군무도 일어날 수 있고,
완전한 정적(靜的) 고요함도 가능하다고 했던 Meece Cunningham의 언급처럼,
우리의 몸도 특정 구조로 인해 특정 움직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다만, 이 잠재력을 매끄럽게 꺼낼 수 있느냐가 문제다.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릎·골반 등 특정 부위가 긴장·유착·통증 등에 시달리면
움직임의 스펙트럼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반대로, “나사집기전이 잘 작동하고, 무릎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고관절 회전과 발목 움직임이 조화롭다면”
우리 몸은 직선부터 원·나선·S자 등 모든 경로를 자유롭게 뻗을 수 있다.
이는 운동선수나 무용수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움직임의 다양성”**과 **“부상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귀중한 통찰을 준다.
또한 임상에서 재활을 돕는 물리치료사나 운동지도자들은,
“시간·공간”의 컨셉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무릎과 하지가 회전하며 움직이는지를 관찰·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결론적으로, 하지의 움직임—특히 무릎의 이완과 나선형 구조—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춤추고, 걷고, 달리고, 심지어 멈춰 설 수도 있는지를 밝히는 열쇠다.
구조는 기능을 낳고, 기능은 다시 구조를 재구성한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인체의 무한한 가능성과 섬세함을 재발견할 수 있다.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회전과 이완이 제대로 작동하면,
하나의 작은 스텝도 마치 공간을 가로지르는 안무처럼 우아해질 수 있는 것이다.'필라테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바닥에서 척추까지: 하지 사슬 완벽 해부 (0) 2025.04.05 근막과 필라테스의 관계|움직임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된다 (0) 2025.04.04 척추의 곡선을 이해하면 운동이 달라진다|센터드 필라테스 시각으로 본 척추 (0) 2025.04.04 움직임의 선순환 만들기|센터드 필라테스가 말하는 기능적 움직임 (0) 2025.04.04 센터드 필라테스 수업 구성법|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3가지 포인트 (0) 2025.04.04
leeum
몸의 원리를 이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